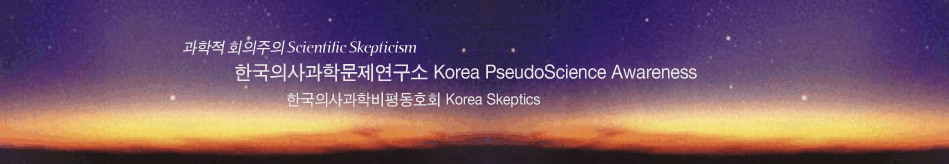2011년 전 세계 GM작물 재배면적 현황 및 관련 동향
KBCH 조정숙 연구원
GM작물이 상업화된 1996년부터 재배현황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제농업생명공학응용서비스(이하, ISAAA)가 2011년도 재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M작물 재배 면적 현황과 GMO관련 동향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2011년 GM작물의 재배면적은 1억 6,000만 ha로, 2010년 보다 1,200만 ha(8%)가
증가하였다.
Ⅰ. GM작물 재배 현황
2011년 GM작물의 재배면적은 1억 6,000만 ha로, 2010년 보다 1,200만ha(8%)가 증가하였다.(그림1) 1996년과 비교했을 때 재배면적은 9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GM작물이 상업화된 이래로 1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1년은 29개국, 1,670만 농민에 의해 GM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졌다.(표1) 미국이 가장 많은 면적인 6,900만 ha에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브라질(3,030만 ha), 아르헨티나(2,370만 ha), 인도(1,060만 ha), 캐나다(1,040만 ha)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GM작물을 재배하는 1,670만 농민 중 90%인 1,500만 농민이 개도국의 소농이며, 중국과 인도의 1,400만 농민들에 의해 1,450만 ha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49.87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 GM작물 재배 면적은 산업 국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GM작물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5개국으로 이들이 GM작물 재배면적의 44%(7,140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산업국의 2010년 대비 2011년 GM작물 채택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개발도상국이 11%(820만 ha)로 산업국의 5%(380만 ha) 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효과역시 개발도상국이 77억$로 산업국가의 63억$ 보다 높았다.
1. GM작물별 재배면적 현황
주요 4대작물인 GM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의 재배 면적은 그림2와 같다.
1) 대두
2011년 GM대두의 재배면적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47%인 7,540만 ha이며, 11개국에서 재배되었다. 이는 2010년 7,330만 ha보다 210만 ha(3%)가 증가한 수치이다.
대두 재배면적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나라는 브라질로 작년 대비 16%(280만 ha)가 증가하였고,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작년대비 재배면적이 각각 210만ha, 30만 ha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GM대두의 국가별 재배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2,920만 ha), 아르헨티나(1,920만 ha), 브라질(2,060만 ha)이며 그 외 8개국(파라과이, 캐나다, 우루과이, 볼리비아, 남아공,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1996년~2010년까지 15년 동안 GM대두 재배로 농민들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284억 $이고, 2010년에만 33억 $에 달한다.
2) 옥수수
GM옥수수의 2011년도 재배면적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32%에 해당되는5,100만 ha이며, 16개국에서 재배되었다. 이는 2010년 4,600만 ha보다 500만ha(9%)가 증가한 수치이다.
옥수수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3개국은 미국(+210만 ha), 브라질(+180만 ha), 아르헨티나(+90만 ha)로 각각의 재배면적은 3,390만 ha, 910만ha, 390만 ha이다. 1996년~2010년까지 15년 동안 GM옥수수 재배로 농민들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217억 $이고, 2010년에만 50억 $이다.
3) 면화
GM면화는 2010년보다 18%(370만 ha) 증가된 2,470만 ha에서 재배되었다. 총 13개국에서 재배되었으며, 인도(1,060만 ha), 미국(490만 ha), 중국(390만 ha), 파키스탄(260만 ha)에서 전체 GM면화 재배면적의 78%가 재배되었다. GM면화가 가장 많이 재배된 인도의 GM품종 채택률은 88%이며, GM작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미국은 90%에 달한다.
2011년에는 면화의 재배면적 증가율이 가장 컸는데 이는 면화의 가격이 떨어지다가 2010년에 면화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2011년 재배면적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96년~2010년까지 15년 동안 GM면화 재배로 농민들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254억 $이고, 2010년에만 52억 $였다.
4) 캐놀라
2011년 GM캐놀라의 재배 면적은 2010년보다 17%(120만 ha) 증가된 820만 ha에서 재배되었다. 미국과 호주에서 GM캐놀라의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캐놀라가 식용유와 바이오디젤 생산의 원료로 이용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캐나다에서 크게 증가(+140만 ha)하여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었다. 전체 캐놀라 재배면적 3,100만 ha중 GM캐놀라는 26%인 820만 ha에서 재배되었으며, 주요 재배국은 캐나다(770만 ha), 미국(37만 ha), 호주, 칠레이다.
1996년~2010년까지 15년 동안 GM캐놀라 재배로 농민들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27억 $이고, 2010년에만 5억 $에 달한다.
2. 형질별 재배면적 현황
1996년 GM작물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초제내성 작물이 우위를 차지해 왔다. 1996년~2010년까지 15년 동안 제초제내성 작물로 얻은 경제적 혜택은 248억 $, 해충저항성은 434억 $, 기타 형질은 2억 $에 이르며, 2010년에만 43억 $, 95억 $, 2억 $의 효과를 창출했다.
1) 제초제내성
제초제내성 작물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제초제내성 작물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59%인 9,390만 ha에서 재배되었는데, 이 수치는 2010년 61%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듯하지만 재배면적으로는 460만ha(5%)가 증가된 수치이다.
2) 복합형질
복합형질 작물의 재배면적은 2010년 3,230만 ha보다 990만 ha 증가한 4,220만ha에서 재배되었으며,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26%를 차지하였다. 주로 옥수수와 면화에 복합형질이 많이 적용되었으며, 브라질에서만 복합형질 GM옥수수의 재배면적이 340만 ha 증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에서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복합형질 GM작물의 재배면적은 2007년부터 해충저항성 GM작물의 재배 면적 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복합형질 옥수수와 면화는 생물학적/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내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재배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합형질 작물은 미국(3,070만 ha), 아르헨티나(410만 ha), 브라질(400만 ha), 남아프리카공화국(110만 ha), 캐나다(100만 ha), 호주(60만 ha), 필리핀(54만 ha) 외에도 우루과이, 온두라스, 칠레, 콜롬비아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3) 해충저항성
2011년도 해충저항성 작물의 재배면적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15%인 2,390만ha에서 재배되었으며, 이는 2010년 2,630만 ha보다 9%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3. 전체 재배면적 중 GM작물의 비중
4대 작물(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을 대상으로 세계 경작면적 중에서 GM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옆의 표2와 같다. FAO의 2009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작물 재배면적 중 GM작물이 차지하는 재배면적 비중은 약 50%(49.8%)로 2010년 47%보다는 증가하였다.
4. GM작물의 시장 가치
Cropnosi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GM작물의 시장가치는 133억 $에 이르며 이는 전체 종자시장 가치인 340억 $의 35%에 해당한다. 옥수수가 65억 $, 대두가 44억 $, 면화가 18억 $, 캐놀라가 3억 $로 이 수치는 기술 이용료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Ⅱ. 주요 농산물의 수출입과 GMO
GM작물 재배면적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은 주요 농산물의 수출국들이다.(표3) 작물에 따라 순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3개국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이 국가들의 GM품종 점유율은 80%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GM작물 재배면적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77%에 해당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였지만, 늘어나는 인구와 기후 변화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에너지 및 바이오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여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은 GM면화만 재배되고 있으며, GM옥수수와 대두는 수입하여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바이오에탄올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하고 사료로의 이용이 늘고 있어 옥수수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GM작물의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한국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자급률이 매우 낮고,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사료용과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출국에서 GM품종이 대거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GMO의 심사/승인, 검역조치와 사후 모니터링 등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대두를 이용한 식문화가 발달하여 대두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며, 화훼류인 GM 파란장미를 제외하고는 GM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다.
1. 대두의 수출입과 관련 GMO동향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대두 수출물량(2011/12년 96.9백만 톤)의 88%를 차지하고 있다.(표4) 수입 국가는 중국과 EU, 기타 아시아 국가들로 중국이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GM대두의 재배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수입하여 가공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양도 면화, 옥수수와의 경쟁력에 밀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수입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는 GM대두가 재배되지 않으며, 일부 품종에 대해 식용·사료용·가공용으로 수입이 허가되어 있다. EU의 사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국들이 GM대두를 재배하고 있어 수입물량에 GM작물의 혼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U의 무관용 원칙(미승인 GMO의 혼입치 0%)으로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자2011년 EU집행위원회는 혼입치를 0.1%로 조정하였다.
2. 옥수수의 수출입과 관련 GMO동향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옥수수 수출물량(2011/12년 95.1 백만 톤)의 73%를 차지하고 있다.(표5) 수입 국가는 주로 일본, 한국, 멕시코 등으로 3개국이 전 세계 옥수수 무역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이 쌀인 아시아지역은 쌀의 생산비중이 높아서 다른 가공 및 사료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한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하며, 사료, 산업용(바이오연료),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사료의 수요와 바이오연료의 원료로의 관심이 높아져서 2010년부터 수입이 큰 폭(2009년 9.7만 톤에서 2010년 16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3. 면화의 수출입과 관련 GMO동향
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이 전 세계 면화 수출물량(2011/12년 3,630만 베일)의 61%를 차지하고 있다.(표6) 수입 국가는 중국과 방글라데시, 터키 등 아시아 국가들로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GM면화의 도입으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경험하였으며, 면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0년 대비 수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호주는 2011년 GM면화가 52만 ha에서 재배되었으며, 약 95%가 복합형질을 갖는 품종이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재배면적이 10%나 증가하여 그에 따른 생산량도 증가하고 수출량도 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GMO 최근 이슈
1. 표시제
GMO 표시제 이행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수출국이면서 GM작물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표시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국이면서 GM작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EU, 한국, 일본 등)에서는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표7)
이러한 정책적 차이로 수출국에서는 각기 다른 수입국의 조건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수입국에서는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등 각국 간 수출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GM연어의 승인을 앞두고 각 州마다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 또는 금지에 관한 법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어업이 성행하는 연안 州에서는GM연어의 도입을 막고 구분유통하기 위해 GMO 금지법 혹은 의무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州에서는 표시제가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2년 11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
2. 비의도적 혼입(Adventitious Presence)과 저수준혼입(Low Level Presence)
GM작물 생산 및 교역 상황에서 100% 순수한 non-GM작물의 교역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작물에 대한 비의도적혼입기준(Adventitious Presence, AP)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AP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EU는 0.9%, 한국은 3%, 일본은 5%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P와는 별도로 수출국에서는 승인이 되었지만 수입국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은 GMO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AP와 구분하여 저수준혼입(Low Level Presence, LL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 간 교역할 때 미승인 GMO 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U, 한국, 일본 등에서는 LLP를 설정하였다.(표8)
무관용 원칙(LLP 0%)을 고수하던 EU에서 미승인 GMO 혼입으로 교역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6월 사료에 한해서 기준치를 0.1%로 조정하였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사료용에 한해서 미승인 GM농산물의 LLP 허용기준을 각각 0.5%와 1%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 환경에 대한 우려
GMO가 환경에 방출되는 경우 생물다양성을 침해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안전성평가를 마쳤지만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GM연어가 사육되는 양식장에서 야생으로 방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GM연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GM금지법안 또는 표시제 마련의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GM작물이 근교 non-GM작물 재배지로 유출이 되거나 운송 중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책임 및 보상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도 귀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5차 의정서당사국 총회에서는‘책임구제추가의정서’를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EU 6개국에서 GM작물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GMO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11월 국사원(프랑스 최고행정기구)으로부터 GMO 금지조치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금지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부정적인 정책과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생명공학기업인 바스프와 몬산토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GMO와 관련된 사업을 철수하였다.
4. 개발도상국에서의 GMO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식량 증산을 위해 농업생명공학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 안보 및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생명공학연구 정책을 마련하고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기술력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재배가 허가된 GM면화의 경우, 자국 내 상황에 맞게 개량 및 개발한 것이다. 이외에도 파파야, 옥수수, 벼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파이테이즈 GM옥수수와 해충저항성 Bt벼는 2009년에 바이오안전증서를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업화되지는 않았다.
인도 역시 GM면화의 도입으로 많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식용으로 이용될 Bt가지에 대해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웃나라가 이룩한 경제적 성장을 보고 GM작물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황금 쌀의 상업화가 2~3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은 GM작물의 추가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각 나라들은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경작조건이 나빠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농업생명공학 및 GMO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빠르게 수용되지는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농업생명공학 및 GMO 도입을 위해서 사회/경제, 과학기술, 자본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기구, 빌 앤 멜린다게이츠 재단, 국가 간 농업생명공학연구단 협력 등이 구성되어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섰고, 우려하고 있는 인구증가와 식량부족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GMO와 농업생명공학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GMO는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어 아프리카(인가증가율이 가장 높음) 등 개발도상국에서 GMO를 수용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GM종자 산업과 지적재산권
2011년 GM종자(옥수수, 대두, 면화)의 시장가치는 130억 $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표9) GM종자 시장은 1996년 처음으로 상업화 된 이후로 그 판매를 몬산토, 듀폰, 신젠타가 주도하고 있으며, 몬산토가 GM형질의 연구개발 및 기업 인수과정을 통해 종자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그림4) 주요 종자회사들은 GM작물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형질에 대한 상호 협약 및 특허기술이용 허가를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GM종자는 기술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 개발도상국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경제적 문제 및 국가 간 이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WTO는 특허권 보호1)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는 정당한 계약 및 그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무단으로 GM종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료가 포함된 GM종자는 가격이 비싸서 농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 및 종자의 가격이 치솟고 있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식량위기와 세계 경제 위기상황이 맞물려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그림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