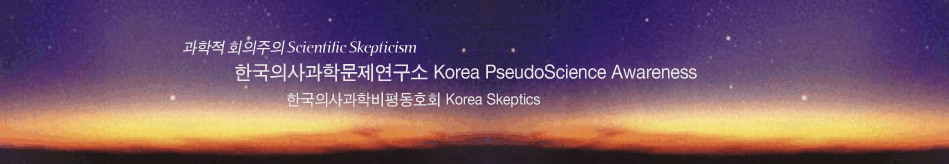|
|
 |
 |
|
|
창조론/과학적 사실성
|
| 00/03/24 글 옮김, 다윈론과 신다윈론, 개론적 해설 |

 |
|
| 글쓴이 : kopsa
날짜 : 00-10-10 16:01
조회 : 5020
|
|
|
00/03/24 글 옮김, 다윈론과 신다윈론, 개론적 해설
19세기 다윈이 제시한 진화론을 다윈론(Darwinism)이라고 부른다. 그후
진화론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유전학 등의 진보를 포함시킨 것이 되었으며
이를 신다윈론(neo-Darwinism)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는 어렵게 보이는
진화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적 이야기와 함께 나타내었다.
1. 다윈의 진화론 배경
다윈(Charles Darwin, 1809-82)은 22세가 되던 1831년 케임브리지에서
만난 식물학자 헨슬로(Stevens Henslow)의 소개로 비글호(HMS Beagle)에
올라 5년간에 걸친 항해를 시작했다. 1832년 2월 29일 브라질의 울창한 삼
림에서 생물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놀랐다. 1834년 2월 티에라 델 푸에고
(Tierra del Fuego)에 도착하여 목격한 원시인에게서 인간의 조상이 동물
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만일 인간과 생물종이 같은 하나의 원시 생명 형태로부터 진화된 것이라
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835년 4월 안데스를 가로지를 때에
7,000피트의 높이에서 발견한 화석화된 나무숲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그 화
석이 놓여 있는 범위는 해저용암과 화산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돌같이 굳은 나무들은 지각의 격변에 의한 융기 형성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그는 상상하였다.
생명의 분방한 풍부함, 인간과 동물의 유사함, 그리고 광대한 시간 스케
일, 이 세가지는 다윈의 커다란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다윈은 다양한 생명
체의 변이의 자국을 더듬어 내려갔다. 우연의 변이들 중에 어떤 것만이 살
아 남아 새로운 종으로 발달할 것인지는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
한다고 다윈은 보았다. 생명체가 엄청난 낭비 속에서 생식하기 때문에 자
연선택은 자연스럽다.
실제 다윈은 비글호의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인 1838년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책을 읽고 자연선택을 도입했다. 맬더스는
1798년 '인구원리에 관한 에세이(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
서 인구의 증가는 식량의 공급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이 때문에 인구의 증
가가 억제된다고 했다.
또한 진화가 격변적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본 것은 라이엘
(Charles Lyell, 1797-1875)의 1830년 '지질학 원리(The Principle of
Geology)'에서 균일론의 아이디어를 택한 것이다. 라이엘은 지질학적 구조
가 매일 매일 일어나는 과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정상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다윈은 1842년 6월, 35 쪽의 진화 아이디어가 담긴 요약문을 썼고 1844
년에는 230 쪽으로 확장하였다. 종교적 문제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일어났다. 1858년 당시 말레이 반도에 있던 월리스
(Alfred Russel Wallace)가 말레이 제도에 관한 논문을 그에게 보내 의견
을 구한 것이다. 놀랍게도 그 내용에는 다윈 자신과 같은 진화에 대한 아
이디어가 들어 있었다. 다윈은 자신의 것과 월리스의 것을 1858년 7월 1
일 린네학회에서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다윈도 린네도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 '종의 기원'과 의미
그 다음에 다윈은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기 시작하여 1859년 11월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을 출간하였
다.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에도 일련의 추가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다윈은 비글호 여행 등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증거로 하여 자연선택, 점진
적 변이를 골간으로 하는 진화론을 내었다. 그의 진화론의 요점을 정리한
에세이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식물로 장식된, 덤불 속에 앉아 울고 있는 새들과, 여
러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그리고 습기진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있는
혼란스럽게 엉킨 뚝을 눈여겨보는 것은 흥미롭다. 또한 서로 각기 다르고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정교하게 구성된 형태들이
모두 우리주위에 작용하는 법칙들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들 법칙은 가장 넓은 의미로 보아 생식에 의해 수가 늘어난
다는 것이다. 이때 생식이란 거의 유전이라는 의미이며, 간접 직접적인 생
활조건에 의해 그리고 용불용에 의한 변이가 생기며, 증가율이 생존경쟁이
필요할 정도로 높고, 그리고 자연선택의 결과로써 형질의 다양성과 덜 향
상된 형의 절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전쟁에서 기근과 사
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의기양양한 것, 다시 말해 더 고등의
동물이 직접 출현한다. 최초에 창조주가 몇개의 형이나 또는 한개의 형으
로 숨쉬게 했던, 그리고 이 행성이 중력의 정해진 법칙에 따라 회전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감탄할 만한 끊임
없이 많은 생명이 진화되었고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는, 이 생명관은 장엄
하기조차 하다."
이 글에서 다윈이 진화론을 내던 때에 라마르크(Jean-Baptiste Lamarck)
의 용불용을 포함한 환경에 의한 개개 생물체의 변이가 혈액을 통해 생식
질에 전달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화론을 내던 때에 돌연변이를 알지 못했던 다윈이 어떻게 변이
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
하다. 다윈 진화론의 필수개념은 변이의 유전이 아니라 적자생존에 의한
자연선택이다.
또한 위의 글에서 다윈이 승리적인 형태의 생명을 패배한 것보다 좀 더
고등의 것으로 기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화에 목적성이나 방향성
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윈이 가끔 민족주의적 또는 제국주의적 용어
로 생존을 위한 전투를 기술했다는 것과도 관련된, 비유의 습관에 기인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 신앙의 기틀이 되는 창세기의 해석에 타격을 주
었다. 케임브리지에서 목사가 될 교육을 받은 다윈이지만 그는 과학을 견
지하여 "불신의 덩굴이 아주 서서히 나의 위를 뻗어나갔으나 드디어 완전
히 사로잡았다"라고 회상하였다. 위에 인용된 '창조주(Creator)'라는 용어는
'종의 기원' 초판에는 없던 것이나 분노한 성직자를 달랠 목적으로 2판에
삽입한 것이다. 그는 후에 "대중의 의견에 굴종하여 창조라는 모세 5경
(Pentateuchal) 용어를 사용한 것을 그이래 오랫동안 후회하였다. 창조라는
말은 진정으로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에 의해 나타난 것을 의미하
였다"라고 적었다.
다윈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종의 기원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원숭이 조상설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윈은 이미 이 내용을 1838년에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낸 적이 있
다. 그리고 1871년의 '인간의 조상(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에서 다윈은 솔직히 원숭이 조상설을 선호하였다.
다윈 진화론의 반대자는 인간의 도덕적 감각과 양심은 신에 의해 심어지
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다윈은 반응은
분명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지성의 결과로써 진화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양친과 자식의 사랑과 같은 특징적인 사회적 본능을 가
진 동물은 어떤 동물이건 그 지적인 힘이 인간에서와 같이 잘 발달하게 되
면 부득이 도덕적 감각 또는 양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신다윈론
종의 기원이 발표되기 반세기전 1809년 라마르크는 '동물 철학
(Zoological Philosophy)'에서 종이 불변이 아니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
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개념을 표명하였
다. 라마르크의 진화의 핵심은 의지력이다. 다시 말해서 동물, 조류, 어류는
의지력의 작용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관은 사용
(use)에 의해 튼튼하게 되며 어떤 기관은 덜-사용(under-use)에 의해 약
해진다. 이러한 획득된 형질은 후대로 유전된다. 라마르크의 유명한 기린
예는 다음과 같다.
"기린(Camelo-pardalis)의 묘한 형태와 크기에서 습관의 결과를 관찰하
는 것은 흥미롭다.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큰 이 동물은 아프리카 내륙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것이다. 그곳 토양은 거의 항상 메마르고 불모이기 때
문에 나무잎을 뜯어먹어야 하며 그 잎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그 종족에서 오랜 세월 유지된 이 습관으로부터 그 동물
의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졌고 목은 뒷다리로 일어서지 않고 6미터(거
의 20피트) 높이가 되도록 정도까지 길어진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의지력이 개입된 습관으로 얻어진 획득형질이 세대를 거치는 동
안 유전되어 오늘날의 동물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용, 불용설로 알려진 라
마르크론(Lamarckism)이다. 당신이 눈이 없다면, 그리고 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계속 보고자 한다면, 마침내 눈이 생긴다고 비유되는 것이다. 라마
르크는 이론을 인정받기는커녕 "과로와 병에 의해 눈이 멀었으며 가난 속
에서 늙은 나이에 반진화론자인 퀴비에의 조롱을 받은 가여운 인물이 되었
다"고 적혀 있다.
다윈도 자연선택에 라마르크의 획득형질의 유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다윈은 획득형질의 유전보다는 예를 들어 기린이 긴 목을 또는 짧은 목을
갖고 태어나는 점에 훨씬 큰 비중을 두어 이것이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친
다고 한 점에서 유전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절의 한계일 뿐 그의 자연선택
설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획득형질의 유전은 독일의 바이스만(August Weismann, 1834-1914)에
의해 수정, 제거되었다. 바이스만은 히드로충류(Hydrozoa)의 성세포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생물은 난자와 정자와 같은 생식세포(germen)에
필수적인 생식인자 즉 '생식질 (germ-plasm)'을 함유한다고 주장하였다. 부
모로부터 자식으로 영속성이 주어지는 것은 생식세포의 생식질이다. 다른
세포, 즉 체세포(soma)는 생식질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인 세포이다.
유전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꼽히는 바이스만은 또한 신다윈론자라고 불
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신다윈론(neo-Darwinism)이 다윈 진화론
의 부분적 변경(modification)과 확장(extension)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
다윈론의 핵심은 자연선택과 유전학의 결합이라는 것을 말하며, 우선 진화
론과 유전학의 시기적 문제를 살펴보자.
다윈의 진화론은 멘델(Gregor Mendel, 1822-84)이 완두콩실험으로 유전
법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시기에 나왔다. 그러나 다윈은 멘델의 연구내용
을 알지 못했으므로 변이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지는 말하지 못했
다. 또한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발견한 드 브리스 (Hugo De Vries,
1848-1935)가 돌연변이를 발견하였으나 같은 시기의 바이스만은 생식질의
불변성만을 말하였다. 변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유
전학의 발달과정을 멘델로부터 살펴본다.
멘델은 21세때 브륀의 아우구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4년 후에 서품을 받
은 신부이다. 1851년 명령에 의해 빈에서 2년간 과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1856년에서 1863년사이 사원의 실험정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하였다. 그는
완두콩을 줄기의 길이, 씨의 모양, 꽃의 색깔 등등 7개의 형질로 구분하여
인공적으로 수정시켰다. 예를 들어 키 큰 식물을 키 작은 식물과 교접시킨
후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식물을 키로 나누어 세었다. 첫 세대의 키는 전
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이 3:1의 비율
로 나타났다.
멘델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적 인자가 존재하
며 이 인자가 생식체(배우자) 형성 시에 분리된다는 이론을 내었다. 개개
식물은 양친의 각각으로부터 한가지 씩 형질을 전달받으며 키 큰 것이 우
성이며 적은 것이 열성이며 이 열성은 후 세대에서 나타난다. 멘델은 이
결과를 1865년 두 차례 브륀자연과학연구회에서 발표하였으며 1866년 정식
논문으로 나왔다. 그러나 계속하여 다른 식물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는
완두통과 달리 분리법칙이 나타나지 않았다. 멘델은 점차 실험에 흥미를
잃고, 수도원장으로 승진하였으므로 과학연구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우연에 의해 멘델이 사망한지 16년이 되는 1900년에 멘
델의 연구는 다시 과학의 주류로 등장한다.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일하던 네
덜란드의 드 브리스 등 3인이 각각 같은 발견을 했고 그 이전의 문헌을 검
토하던 중에 알려지지 않은 잡지에서 30년 전 멘델의 이름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할 때 멘델에게 공헌을 돌렸다. 이것을 멘델법칙의 재
발견이라고 한다.
드 브리스는 옥수수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하였으며
또한 달맞이꽃 교잡연구에서 전혀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유전되는 것을 발
견하여 돌연변이 이론을 내었다. 염색체수의 변화와 관련된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는 오늘날의 유전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돌연변이와는 의미가 다르
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발견
을 진화와 관련지어, 진화과정에서 개체의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체는 변
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좀 더 유리한 돌연변이체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가정을 내었다.
이후 유전학은 1933년 유전의 염색체론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모건
(Thomas Hunt Morgan, 1866-1945)과 X-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도
를 발견하여 1946년 노벨 의학상을 발견한 멀러(Hermann Joseph Muller,
1890-1967)로 이어졌다. 다음에 유전자의 분자적 성격을 규명한 웟슨
(James Watson)과 크릭(Francis Crick)은 1962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다. 이제 생명, 유전, 돌연변이 등에 대한 분자적 기초, 즉 물질적 기초가
확립된 것이다.
정통 다윈론의 '점진적 진화'에 대한 수정 이론도 나타났다. 1972년 엘드
레지(Niles Eldredge)와 굴드(Stephen Jay Gould)의 단속평형설(punctuated
equlibrium)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게시할 것이지만,
이들은 진화가 점진적이라는 데에 반대하여 급작스런 움직임(jerk)에 의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미는 '단속 평형'의 용어에 나타나 있다. '평
형(equilibrium)'이란 오랜 기간동안의 정지(stasis)를 의미한다. 이런 단계
에 있다가 급작스런 짧은 기간의 변화를 '단속(punctuation)'으로 표현한
것이다.
굴드는 또한 자연선택이 통상적 개체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유전자와 종
을 포함한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아이디어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
하여 옥스퍼드의 도킨스(Richard Dawkins, 1941-)는 자연 선택이 개개의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이론을 내었다. 그는 동물에서 나타나는 이타
적인 행동이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생존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모든 최근의 진화론에 대한 진보를 합하여 '신다윈론' 또는
'진화론의 현대 합성(modern synthesis of evolution)'이라고 부른다.
4. 참고
1) 강건일, 신과학 바로알기, 가람기획, 1999.
2) John Carey, ed., The Faber Book of Science, faber and faber,
London, 1995.
3) Daniel C. Dennett, Darwin's Dangerous Idea, Simon & Schuster,
New York, 1995.
4) Martin Gardner, ed., Great Essays in Science, Prometheus Books,
Buffalo, New York, 1994. 00/03/24 글 옮김, 다윈론과 신다윈론, 개론적 해설
|
|
|
|
|